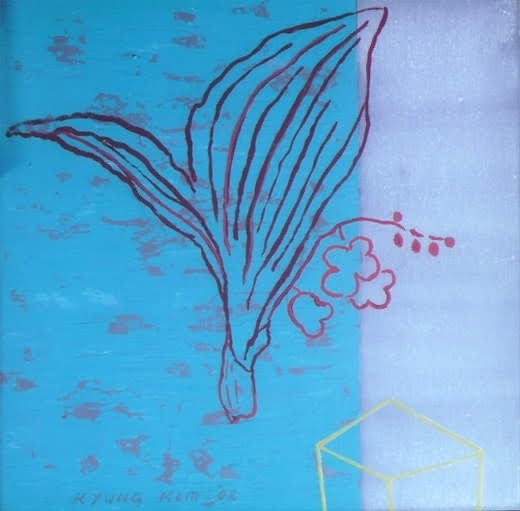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김 종삼 시 ‘묵화(墨畵)‘모두
[처음처럼 / 다산초당] 신경림 엮음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 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 동안 무엇을 하였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광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 김 종삼 시 ‘물통’모두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 밥집 문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 김종삼(1921~1984)시 ‘掌篇(장편).2‘
* 掌篇(장편) :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산문을 이르는 말.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소설, 대개 인생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리는데 유머, 풍자, 기지를 담고 있다.
내용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 김 종삼 시 ‘북 치는 소년’모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 종삼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모두
바로크 시대 음악 들을 때마다
*팔레스트리나 들을 때마다
그 시대 풍경 다가올 때마다
하늘나라 다가올 때마다
맑은 물가 다가올 때마다
*라산스카
나 지은 죄가 많아
죽어서도
영혼이 없으리
- 김 종삼 시 ‘라산스카’모두
* 시집 ‘북치는 소년’ (민음사, 1998)
*라산스카; 뉴욕 출신의 소프라노 가수.
본명; 헐더 라샨스카.
* 팔레스티나; 16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본명; 지오반니 피에르루이지.
하루를 살아도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틀을 살더라도
사흘을 살더라도 평화롭게
그런 날들이
그날들이
영원토록 평화롭게-------
- 김종삼 시 ‘평화롭게’모두
* 시집<스와니江이랑 요단江이랑>.미래사
오늘은 용돈이 든든하다
낡은 신발이나마 닦아 신자
헌 옷이나마 다려 입자 털어 입자
산책을 하자
북한산성행 버스를 타 보자
안양행도 타 보자
나는 행복하다
혼자가 더 행복하다
이 세상이 고맙다 예쁘다
긴 능선 너머
중첩된 저 산더미 산더미 너머
끝 없이 펼쳐지는
멘델스존의 로렐라이 아베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 김종삼 시 ‘행복’모두
* [김종삼전집/장석주 편/청하]
싱그러운 거목들 언덕은 언제나 천천히 가고 있었다
나는 누구나 한 번 가는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악기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 있었다
너무 조용하다
- 김종삼 시 ‘풍경‘모두
공고
오늘 강사진
음악 부문
모리스 라벨
미술 부문
폴 세잔느
시 부문
에즈라 파운드
모두
결강.
김관식,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지름.
지참한 막걸리를 먹음.
교실 내에 쌓인 두꺼운 먼지가 다정스러움.
김소월
김수영 휴학계
전봉래
김종삼 한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을 기다리고 있음.
교사.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에 있음.
- 김종삼 시 ‘시인학교’모두
* 장엄 [莊嚴] ; 위엄이 있고 엄숙함.
** 술에 도취되어 있을 때 시인은 쓰라린 현실로부터 해방되어 잠시나마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순수 고전 음악에 대한 집착, 이국 정취에 대한 애호 또한 그의 ‘술’ 이미지의 내포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은 인파 속에 섞여 속절없이 걷다가 한 평 남짓한 자그만 카세트 점포에서 흘러나오는 피셔 디스카우가 부르는 슈베르트의 「보리수」에 취해 한참을 서 있곤 했다고,,
시를 읽다가 보면 어느덧 따사로운 사람의 온기와 아름다운 것애 대한 순수한 애정을 느낀다. 현실의 참담함에서 시인은 스스로를 이겨내기 위하여 ‘술’이라는 몽롱한 *장대 함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였을까?!…, 그는 영원한 보헤미안이자 무산자(無産者)였으며, 생활인으로서는 철저하게 무능력자였다. 그의 인생에는 생활이 없다. 빈 자리를 채운 것은 시와 음악과 술이다. 그는 자조적으로 “나같이 인간도 덜 된 놈이 무슨 시인이냐. 나는 건달이다, 후라이나 까고.”라고 내뱉었다고,
행의 과감한 생략과 비약으로 불완전한 문장과 불안한 문체를 통해 '여백'이 가지는 미적인 효과를 높이려 했고, 시의 기법을 통해 비어 있는 세계를 깨닫게 하고 독특한 미를 만들어 냈다. 평범한, 스스로 애닳은 인생이 괴롭고 쓸쓸하여 몽롱 했지만,, 그의 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라도 행복 하시길 기원한다. 매년 12월 8일이 오면 소주 한잔 채워 드리게 된다.

'시인, 그 쓸쓸한 영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너는, 꽃- 김 춘수. (0) | 2023.05.29 |
|---|---|
| ‘밥’ 사상 - 김 지하 시인. (3) | 2023.05.20 |
| 5월의 햇살 같은 시/김 영랑 시 . (0) | 2023.05.02 |
| 씨알의 시/김 수영 시. (1) | 2023.04.26 |
| ’악의 꽃‘ -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의 시. (2) | 2023.04.20 |



